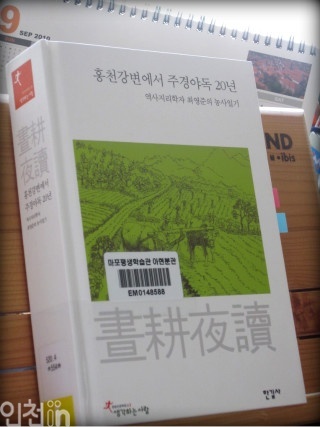《홍천강변에서 주경야독 20년》, 최영준 지음, 한길사, 2010.

강화 장화리의 노을
강화는 섬 치고 논이 상당히 넓은데, 그런 논에 물을 대는 커다란 방죽이 제법 높은 산 아래 반드시 만들어져 있다. 해수면보다 그리 높지 않은 논의 가장자리는 단단한 제방으로 바다와 단호하게 차단돼 있다. 간척의 흔적이다. 바닷가의 만곡부를 둘러쌓은 그 논들이 고려조 때 간척되었다는 걸 《국토와 민족생활사》를 보고 알았다. 지리학은 재미 있는 학문이다. 국토 구석구석에 알알이 맺힌 문화와 역사, 그리고 변화를 읽는 지리학은 어지간한 발품을 팔지 않으면 그 재미를 속속 깊이 알아내지 못할 터. 《국토와 민족생활사》의 저자 최영준은 발품을 팔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통곡리의 논골마을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신혼 초 도심에서 20~3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터를 잡아 아내의 작업실과 자신의 서재를 겸할 수 있는 아담한 집 한 채를 짓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와 화초를 가꾸고 싶던 지리학자는 1980~90년대 대학가의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군사독재를 혐오한 딸깍발이 지리학자는 투사연하며 교수를 헐뜯는데 용감한 반면 학업을 팽개치는 학생에게 회의를 느꼈고, 최루가스로 가득하던 교정을 잠시라도 벗어나야 맑은 정신에 책을 대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1970년대 마음에 두었던 양재천 일원은 이미 개발되었다. 49세를 넘긴 조상이 없었다는 선친의 말씀을 기억한 딸깍발이는 욕심을 버리고 좋은 책 읽으며 덤으로 살자고 만 49세에 S자로 굽이치는 협곡 안쪽,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홍천강변 논골마을에 터를 잡았다.
최루가스, 군홧발, 그리고 틀림없이 잡상인이 들끓었을 1990년대 초반의 교정을 주말마다 떨치고 나간 최영준이 일기 형식으로 쓴 《홍천강변에서 주경야독 20년》은 1990년 4월 21일 토요일부터 시작된다. 일기를 쓰되 절대 “사실이 아닌 것은 한 줄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홍천강변에서 주경야독 20년》은 일기가 그리 진솔하고 재미 있을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한다. 지리학을 연구, 강의하는 직분이라 주말이나 방학이 아니면 자주 찾을 수 없는 딸깍발이는 낮에 주위 농부에게 농사를 배우며 밭을 갈고 늦은 밤까지 책을 읽다 일기장을 펼쳐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터이다.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면서.
초보농군 격에 맞지 않게 넓은 땅을 구입한 지리학자는 살 집을 수선하고 나무를 심으며 산골에 맞는 농사를 시작했다. 농약을 회피하자 늘어난 굼벵이와 지렁이를 반기고, 지렁이를 따라 들어오는 여러 생물들을 눈여기며 회복되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다. 가뭄이 들면 실오라기처럼 흐르는 홍천강도 큰물이 들면 주위 농경지를 집어삼킬 듯 거침없는데, 큰비에 무너지는 논둑과 밭둑과 연못을 그때그때 고치고 퇴비를 만들어 땅을 기름지게 가꾸는 과정에서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가깝게 지내는 친지에게 수확한 농작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만끽하지만 마음 상하게 만드는 존재는 언제나 도시의 불청객이다.
아내가 정성껏 심은 붓꽃을 함부로 캐내며 “야생화에 임자가 따로 있느냐!”며 대드는 전문 사냥꾼들, 10여 년 자라 팔뚝만큼 자란 잉어를 잡으려 남의 집 연못에 버젓이 낚싯대를 드리워놓고 집주인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함, 수확 직전의 농산물을 가져가거나 익은 밤을 몽땅 털어가는 좀도둑은 해마다 어김이 없고 심어놓은 산삼을 몽땅 캐가는 자도 부끄러움이라곤 몰랐다. 기껏 심어놓은 나무를 이웃 염소가 죄 뜯어먹는 일은 참을 만한데, 근사한 승용차를 타고 느닷없이 다가와 펜션사업에 투자해 편히 큰돈을 벌라며 거룩한 표정을 짓는 이를 참고 대하는 일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을 거다. 밀짚모자에 장화를 심은 모습에 촌무지렁이 취급하며 다가오는 찰거머리 같은 도시 사기꾼들은 예나 지금이나 농촌의 기생충이다.
자동차로 접근할 수 없던 궁벽한 논골마을에 도로가 뚫리자 고즈넉한 풍경을 사마귀처럼 어지럽히는 펜션이 들어섰고 급기야 고속도로가 주말마다 농사꾼이 되는 지리학자의 애틋한 땅 상당 부분을 대뜸 집어삼키려들지만 딸깍발이는 선선히 물러선다. 20년 주말을 거의 빠지지 않고 찾아와 봄에 땅을 갈아 씨를 뿌리며 다가오는 산새와 풍락 인파를 번갈아 바라보고, 여름에 큰비로 무너지는 논둑밭둑을 수리하다 근육이 파열되며, 가을 갈무리로 뿌듯하기 전에 도둑의 손이 먼저 다녀간 논밭을 허탈하게 마주하면서도 별이 쏟아지는 밤에 많은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길 수 있었다. 주중에 강의와 연구로 바쁘게 보내다 주말이면 논골마을까지 찾아오는 손님을 맞으며 시골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다니던 두 아들이 군과 대학을 마치자 어느새 정년을 맞은 지리학자는 주저없이 주민등록을 홍천강변으로 바꾸었다. 이제 명실상부한 농부가 된 거다. 한데 서울에서 자동차로 두 시간이면 찾아갈 수 있게 된 논골마을은 수도권의 교외가 되고 있다. 복선이 된 경춘선이 수도권전철과 연결된 이후 수도권 시민들이 번질나게 드나들기 시작한 게 아닌가. 20년 전보다 훨씬 더러워진 홍천강이 언제까지 안녕할 수 있을까. 고즈넉한 정취 안에서 이마에 땀 흘리며 논밭을 일구는 기쁨, 별이 쏟아지는 밤에 접어 두었던 책을 펼쳐 읽는 호사는 도예를 전공하고 은퇴한 부인과 함께하려는 지리학자의 여생 내내 행복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
최영준의 책을 두세 권 읽고 그가 인천 출신이라는 걸 알았다. 논골마을을 불쑥 찾아가 무조건 고맙다 인사하고 밤새 이야기 나누고 싶은 16년 선배인 그 딸깍발이 지리학자. 하지만 찾아갈 자격이 내겐 없을 것 같다. 초면에 어색하기 때문이 아니다. 《홍천강변에서 주경야독 20년》을 읽은 뒤, 자신에게 정직하고 땅에 충직한 태도로 시골에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탓이다. ‘주경야독’. 말이 아름답지 실상은 지칠 수 없는 땀과 동반하지 않던가. 조용히 책을 읽으며 원고를 다듬고, 햇살 맑을 때 이따금 텃밭을 일구는 그림은 《홍천강변에서 주경야독 20년》에서 보인 최영준의 자세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내공 부족한 도시의 서생이 섣불리 도전할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논골마을을 찾아갈 엄두를 감히 내지 못하지만 《홍천강변에서 주경야독 20년》을 덮으며 딸깍발이 지리학자의 여생이 내내 아름답기를 기원한다. 그의 행복한 시골살이는 그이 뿐 아니라 도시 후배의 몸과 마음의 안정을 안내하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