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방인 - ②파리의 날씨
〔인천in〕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서유당’과 함께 어렵게만 느껴지던 동·서양의 고전 읽기에 도전합니다. ‘서유당’의 고전읽기모임인 ‘하이델베르크모임’은 Jacob 김선(춤추는 철학자), 김현(사회복지사), 최윤지(도서편집자), 서정혜(의류디자이너), 소순길(목사)’ 등이 원서와 함께 번역본을 읽어 내려가며 삶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전읽기- 알베르 카뮈(김화영 역), 이방인 L’Etranger, 민음사.
글: Jacob 김 선
“방 안에는 저물어 가는 오후의 아름다운 빛이 가득했다.”
La pièce était pleine d’une belle lumière de fin d’après-midi
따끔한 고통과 뻐근한 후유증 그리고 잠깐의 기다림. 기다림의 기억은 있지만 기다림의 내용은 없다. 방 안에는 인공 빛이 가물거린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즐거운 일이 있는 것 같다. 웃음소리와 가벼운 호흡이 느껴진다. 그 가운데 무어라 말하는 나는 누군가를 불러 무어라 말했는지 물어본다. 그는 흐물거리는 소리라 무슨 말인지 모른다 했다. 내 목구멍이 까칠하다. 무의식중에 내뱉은 소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인공물이 내 목구멍을 헤집고 기어 들어가 기어이 내 위를 인공빛으로 탐색하고 거칠게 빠져 나왔으리라. 내 의식이 생략된 그 첫 시작은 낮은 졸음이었다.
엄마 관이 있는 방 안에서 뫼르소는 졸음이 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엄마의 죽음 앞에서도 저물어 가는 오후의 아름다운 빛 때문인지 살아 있어 졸음을 느끼는 뫼르소는 평온해 보인다. 그 평온함을 은밀히 느끼면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문지기에게 말을 걸어 본다. 기다렸다는 듯이 문지기는 자신의 신상과 파리 날씨에 대한 기억을 말한다. 파리에서는 시체를 사흘씩이나 묻지 않아도 되는 날씨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살았었음을 증명하듯이 그리고 파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마랭고에서 있는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고 싶은 듯이 말이다. 그의 얘기를 듣다보니 영화 <미드나잇인파리>의 하늘이 생각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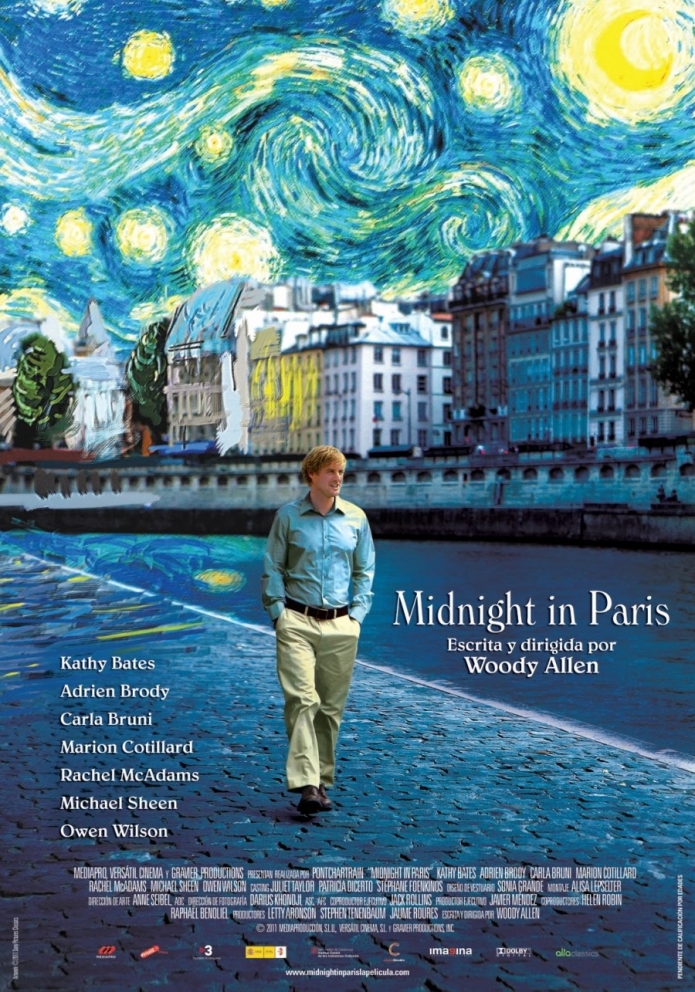
이상한 것은 그렇게 재미있지 않은 문지기의 말을 뫼르소는 재밌다고 생각한다. 먼 진짜 파리 얘기보다는 나에게는 가까운 '파리바게뜨'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더 재밌다. 먼 파리의 날씨는 인터넷 숫자로만 파악할 수 있는데 가까운 파리바게뜨는 날씨판매지수를 개발하여 찬스로스(Chance Loss 판매할 제품이 없어 발생하는 손실)를 방지하고 재고 부담을 줄였다 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날씨경영인증을 획득했다고 한다. 이렇게 파리 날씨를 빵집을 통해 나는 이상하게 즐기고 싶다. 뫼르소처럼 말이다.
파리에 대한 환상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 환상이 파리를 사랑하게 만든다. 환상과 사랑이 서로 맞물려 있는 곳이 파리인 것이다. 문지기에도 파리는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파리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파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환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환상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것인지? 파리는 소위 ‘에우튀프론' 에 언급된 딜레마(Euthyphro dilemma)처럼 모호한 도시다.

그 모호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직접 가서 보는 것이다. 언제 갈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B.C460?~B.C377?)의 <잠언집> 첫 문장으로 유명한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의 격언처럼 짧은 인생 가운데 꼭 가고픈 여행지 파리는 문지기의 과거 속에 있지만 나에게는 현재 진행형이다. 뫼르소도 나에게는 현재진행형이다.
문지기의 파리 얘기에 뫼르소도 나도 빠져들었다. 파리는 이름으로 모든 이를 흡입하는 것 같다. 문지기는 극빈자로 양로원에 들어 왔다고 했다. 파리에서는 어떻게 살았을지 조금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건강해서 문지기 자리에 지원했으나 양로원 재원자는 아니라고 말하는 가운데 양로원 재원자들과 구별짓기를 ‘그들, 저 사람들, 늙은이들’ 등 몇 단어를 통해 드러낸다. 뫼르소는 그걸 놓치지 않고 기억한다.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사뭇 다르지만 그것이 뫼르소인 것이다. 칼릴 지브란Kahlil Gibran(1883~1931)의 <예언자 中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하여> 한 대목 ‘나는 내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만난’ 사람처럼 뫼르소는 자신을 아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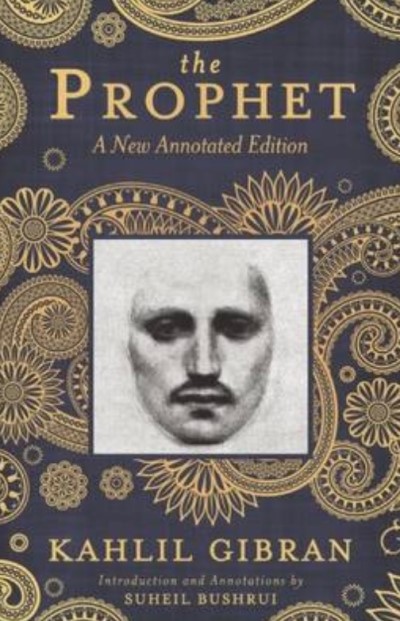
그래서 사뭇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다른지 좀 더 지켜보고 싶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